지도 한 장에 담긴 정보주권, 구글의 반출 요구에 대하여

1. 문제의 제기
1) 고정밀 전자 지도 반출 통제의 근본적 배경
한국 정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으로 약칭)(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등)을 근거로 고정밀 전자 지도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 조치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국가 안보 차원의 위협 대응, 지정학적 취약성, 기술 자산 보호, 정보 유출 방지 등 다층적인 고려사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고해상도 공간 정보가 테러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 당위성이 정책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 할 것이다.
2) 구글의 반출 신청과 위험성 검토 시점
한편 구글은 2025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축척 지도(50m 거리를 지도상 1㎝ 수준으로 표현한 고정밀 지도이다)를 국외에 있는 자사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벌써 3번째인데, 이번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구글의 요청이 자칫 통상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통제하고 있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사이버 안보 위험성은 없는지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간의 경과
구글이 우리나라 정부에 5000분의 1 축척 지도를 요청한 것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1월 구글은 정부에 지도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청했으나 안보 위험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위성 지도 서비스에다가 보안시설 정보 등이 담긴 한국의 고정밀 지도를 결합할 경우 군사기지 등의 노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010년에는 지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내 서버를 이용한다면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구글이 거부했다.
2014년 1월에는 「측량수로지적법」(현 「공간정보관리법」)을 개정해 축척 2만 5000분의 1 영문판 지도의 국외 반출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 등 국내에 서비스하는 외국 기업들은 2만 5000분의 1 지도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리고 2만 5000분의 1 보다 정밀한 지도는 원칙적 반출을 불허하며, 반출 요청 시 8개 부처가 참여하는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허가 여부를 논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2016년 6월, 구글은 2차로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축척 지도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외반출 협의체가 구성돼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지도에서 국내 보안시설 등을 가림(blur, 블러) 처리하는 조건으로 5000분의 1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이 서비스 품질 저하를 이유로 불수용 의견을 제시하자 협의체는 최종 회의에서 반출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매 9년의 간격을 두고 2025년 2월 18일, 구글은 3차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축척 1대 5000의 수치지형도(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과거보다는 유연하게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정부와 소통할 임원급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은 물론 직통 전화를 개설하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그 대신 가림처리를 위해 보안시설의 좌푯값 제공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체가 심의를 시작하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구글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60일 연장이 가능하므로 마감 시한인 오는 8월 11일까지 이를 재논의키로 했다.
3. 안보 관점에서의 구글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한 검토
1) 우려되는 점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남북이 여전히 대치 중인 상황에서 외국 기업에게 고정밀 전자지도를 제공하는 것은 군사시설 등 민감한 시설의 노출 가능성이 증대됨을 의미한다. 국가 안보에 밀접한 국가 기밀 데이터를 국외에 개방하는 경우 지도 서버에 대한 보안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구글이 국내에 지도 전담 인력을 상주시키더라도 글로벌 경영으로 인한 소통이 어려울 것이며, 중요 정보를 유·노출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국내 사업자에 비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2) 우크라이나 사례로 본 안보 위협
언론에 따르면, 구글 지도가 업데이트되면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비밀 군사시설의 위치가 공개됐다며 우크라이나 군사 당국이 구글에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구글이 상황을 바로잡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됐다고 한다.1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을 이용 한 전쟁이라는 주요 특징을 띠고 있으며, 드론이 전쟁 수행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 활발해지는 현대전에서 전자적 데이터는 드론을 통해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기에, 전쟁 당사국의 주요 시설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공개되는 경우 전쟁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2
3) 좌푯값 요구와 정밀 타격 위험
구글은 이번에 지도 반출을 3번째로 요청하면서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가림 처리를 할테니 여기에 필요한 보안 시설의 좌푯값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글에 국가 보안시설 위치를 모두 넘기게 되면 좌푯값 반출을 통해 주요 시설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앞서 본 우크라이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고정밀 지도를 위성 영상과 중첩하면 군사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 내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 파악도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3
4) 국내외 지도 서비스 비교 및 수정 요청 거부 사례
2019년 10월에 국내 군사 시설 및 기지 120개소를 대상으로 민간 지도 서비스상 위성 및 항공사진 노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네이버 및 카카오는 0건(0%) 구글은 120개(100%)의 군사시설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회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은 우리나라 전체 군사보안시설의 40%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구글이 신청한 정밀 지도 정보가 위성영상 정보와 결합되면 보안시설의 위치를 특정하기 더욱 쉬워진다는 문제점도 있음을 덧붙였다.
국방부가 구글의 위성지도 서비스인 구글 어스에 노출돼 있는 국가 주요 안보시설에 대해 구글 측에 ‘저해상도 처리 요청’을 했지만 3년 넘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구글 어스에는 우리나라 군사분계선 부근의 GP 초소나 방호시설 같은 군사기지는 물론, 비행장 등 주요 안보 시설이 무더기로 노출돼 있으나 구글은 무시하고 있다. 유사 사건이 있는지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대만 국방부는 2016년 9월, 남중국해에 있는 타이핑다오 위성사진에서 군사용 시설을 가림 처리해 줄 것을 구글에 요청했으나, 구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성지도를 임의적으로 편집하지 않는 것이 구글의 원칙이라고 밝혔다.5 또한 벨기에 국방부는 구글이 위성사진을 서비스할 때 벨기에 주요 시설을 뿌옇게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6 7
반면 구글은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주요 우방국의 국가 안보 시설에 대해서는 저해상도 및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방국의 국가 안보 시설이라고 하여 모두 가림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국의 요구에 따라 구글이 부분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보인다.8
4. 해외 국가들의 지도 정보 규제 사례
1) 이스라엘의 사례(미국, 킬-빙가만 수정법)
중동의 화약고인 가자지구는 자주 해외 뉴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이스라엘이 로비를 통해 미국의 법률을 개정한 것이 바로 킬-빙가만 수정법(Kyl-Bingaman Amendment)이다. 미국 회사들이 이스라엘 영토에 대해 2m 이상의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존 킬(Jon Kyl) 상원의원과 데이비드 빙거맨(David Bingaman) 하원의원이 발의, 1997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일부로 통과됐다.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상세한 위성 정보가 테러 공격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제정됐다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2020년 7월 21일 수정법 일부가 완화돼 종전 2.0m GSD(Ground Sample Distance) 해상도 제한에서 0.4m GSD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비(非) 미국 상거래 소스에서 0.4m GSD 해상도로 이스라엘 위성 이미지가 쉽고 지속적으로 제공됨에 따른 것이다(0.4m GSD 기준 이하 고해상도 위성사진은 약 5000대 1에서 1만 대 1 축척 지도 사이라고 한다).9
2) 미국의 규제 사례
일반적인 경우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은 50만 분의 1 이하 대축척 지도나 차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방위나 외교 정책 이익을 위해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군사적 내용이 반영된 정보성과물((geomatics product) : 이미지(image), 이미지 데이터(image data) 또는 지리공간정보)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법적 근거는 U.S.C. Title 10 §455(미국법전 제10편 제455조)에 명시).10
3) 중국·사우디·인도의 규제 사례
중국은 표면상 반출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내 기업과 제휴를 통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보안 시설에 대한 사전 블러링과 의도적으로 왜곡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기밀 공간 정보는 지도상 표기, 명칭 공개 등이 금지돼 있으며, 인도 기업들은 허가 없이 데이터 수집, 생성, 저장 및 공유할 수 있지만, 외국 기업은 인도 기업의 API를 통해서만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고, 재사용 또는 재판매에 제한이 있다. 구글 또한 고정밀지도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도 기업의 API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5. 구글의 주장 대 국내 업계의 반론
현재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맞서 관련 업계에서는 반대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데, 구글이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근거로 우선 주장하는 것은 구글맵 서비스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이 제고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내 업계에서는 타 해외 기업들 및 국내 기업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지도 기능 서비스 중에 있는데,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많은 해외 기업들(특히 애플)은 2만 5000대 1 축척의 지도로도 길 찾기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 중에 있어 고정밀지도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 편의 기능은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구글은 지도의 국외 반출은 여러 국가의 데이터센터에 지도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어 특정 국가를 정할 수 없고, 이 정책에 따라 한국의 지도 데이터도 국외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속·안정적인 지도 관련 서비스는 한국 내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구현이 가능하지 외국에 이전된 데이터와의 결합으로는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국내 업계는 반론을 제기한다. 아울러 데이터의 국외 이전 시 국내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사전·사후 규제의 회피 및 정보주권의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셋째로 구글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통해 위치 기반 서비스 혁신이 촉진되고 국내 IT 생태계가 글로벌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업계는 구글 지도 기반의 수익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됨에 따라 국내 지도 업계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6. 우려되는 사항
1) 반출 승인 시 후속 요구 및 사후 관리 어려움
벤츠, BMW, 포드 등 미국, EU 등의 글로벌 자동차 주요 기업들도 스마트 내비게이션 및 자율주행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공간정보 국외 반출 신청을 하거나 타진한 바 있다. 애플은 지난 2023년 구글과 비슷한 사유로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을 신청한 바 있어(반려됨), 이번 구글의 반출 신청이 승인될 경우 곧이어서 반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두 등 중국 기업들도 공간정보 국외 반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정 국가만 승인하거나 특정 국가는 배제할 수 없어 외교·통상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국가, 기업들에 공간정보 국외 반출이 승인될 경우, 해외 소재 기업에 대한 집행력 미비로 사후 관리·감독이 어렵고, 일부 가능하다고 해도 적지 않은 비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장기적 주권 침해 우려
구글의 한국에 대한 자세에서 볼 때 독도에 대한 구글 측 표기 방식(일본 내 구글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 혹은 리앙쿠르 암초 등으로 표기한 데 이어 한국 구글 지도에서도 독도 위치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국내 수정 요구는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구글의 지명 명칭 오기, 수정 요청 불수용 시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특히 구글 지도가 글로벌 지도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 사용자들이 구글 지도를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구글이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용되면서 상당한 권위를 얻어 국제관계에서 준주권적 실체로 자리 잡고 있음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구글 맵스(maps)는 준주권적(quasi-sovereign) 지위를 획득해 국경 및 지명 분쟁에서 최초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예시이다.11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주권’의 인식도 제고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디지털 시대에 국가가 자국 내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대한 법적 권한과 통제권을 갖는다는 원칙인바, 고정밀 지도 반출은 자칫 정보주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7. 결론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군사 시설의 노출 위험과 반출 이후 수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사후 관리의 어려움 우려, 그리고 관련 산업계에 끼치는 경제적·산업적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고정밀지도 정보는 국가안보, 국가 정보주권 수호 측면에서 단순한 정보기술 보호 차원을 넘어서 분단 체제의 지속과 첨단 군사 기술 경쟁시대에 필수적인 국가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사안이다. 해외의 안보 상황과 남북이 대치된 분단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안보상황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국가 안보 위험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전국 팔도를 한걸음 한걸음 걸으며 지도를 만드신 ‘고산자 김정호’ 선생의 위업을 계승하는 길이다.
참고문헌
- 디지털데일리(2025.3.18.), [빅테크24시] 구글, 세번째 韓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안보·기술 주권 흔들리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92855?sid=004.
- 연합뉴스(2025.2.28.), 구글, 9년만에 정밀지도 해외반출 요구… 이번엔 안보우려 넘을까. https://v.daum.net/v/20250228115322133.
- 뉴시스(2025.3.15.), 고정밀 지도 함부로 내주지 못하는 이유…주권·안보 직결[구글 韓지도욕③].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4_0003099715.
- 한겨레(2025.3.18.), 구글, 5천분의 1 ‘고정밀 지도’ 반출 재요청…한‧미 통상 갈등 ‘새 불씨’, 구글 3차 요청에 네이버·카카오 반발 분위기, ‘상호 관세’ 트럼프 정부, 통상 갈등 키울 수도.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87637.html.
- 조선일보(2024.11.6.), “구글맵 업데이트로 우크라이나 비밀 군사 기지 노출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4/11/05/BCFJ42AFENBGRH6OEJMCSL7LEY/.
- 머니투데이(2019.10.20.), 구글 위성지도에 軍시설 40% 노출…구글은 왜 안지울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2014475566138.
- 조선일보(2024.10.8.), 구글, 안보시설 삭제 요청 3년째 무시.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4/10/08/PDZVNXCCZNBG3NSNZD4OPB44EI/.
- 동아사이언스(2016.9.29.), 구글 “대만 위성 지도도 블러처리안 해.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14033.
- 연합뉴스(2018.9.28.), “구글 고소할 것”… 위성사진의 주요시설 표시 놓고 다툼. https://www.yna.co.kr/view/AKR20180928167700098.
- FAS(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2018.12.10.), Widespread Blurring of Satellite Images Reveals Secret Facilities, https://fas.org/publication/widespread-blurring-of-satellite-images-reveals-secret-facilities/.
- BBC(bbc.com)(2018.9.28.), Google to be sued by Belgium for not blurring military sites, https://www.bbc.com/news/technology-45681213.
- 조득성(2024), 포털사이트 지도상 국가중요시설의 위치노출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군사시설 및 기지내 노출된 시설을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24(4), 185-194.
- 문정균, 유선봉, 전창우(2020), 구글(Google)의 전자지도 국외반출요구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역외적용에 의한 입법개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제20권 제1호, 13-24.
- 국회도서관(2017), 미국의 군사공간정보관련 입법례, 법률정보실외국법률정보과, 1-5.
- Katz(2023). One Map to Rule Them All: Google Maps and Quasi-Sovereign Power in International Legal Disputes, 14 Hastings Sci. & Tech. L.J. 67.
- 조선일보(2024.11.6.), “구글맵 업데이트로 우크라이나 비밀 군사 기지 노출돼”. [본문으로]
- 조득성(2024), 포털사이트 지도상 국가중요시설의 위치노출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군사시설 및 기지내 노출된 시설을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24(4), 185-194. [본문으로]
- 문정균, 유선봉, 전창우(2020), 구글(Google)의 전자지도 국외반출요구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역외적용에 의한 입법개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제20권 제1호, 13-24. [본문으로]
- 조선일보(2024.10.8.), 구글, 안보시설삭제 요청 3년째 무시. [본문으로]
- 동아사이언스(2016.9.29.), 구글 “대만 위성 지도도 블러처리안 해”. [본문으로]
- 연합뉴스(2018.9.28.), “구글 고소할 것”… 위성사진의 주요시설 표시 놓고 다툼. [본문으로]
- BBC(bbc.com)(2018.9.28.), Google to be sued by Belgium for not blurring military sites. [본문으로]
- FAS(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2018.12.10.), Widespread Blurring of Satellite Images Reveals Secret Facilities. [본문으로]
- 美공간상업국(http://space.commerce.gov). [본문으로]
- 국회도서관(2017), 미국의 군사공간정보관련 입법례, 법률정보실외국법률정보과, 1-5. [본문으로]
- Katz (2023). One Map to Rule Them All: Google Maps and Quasi-Sovereign Power in International Legal Disputes, 14 Hastings Sci. & Tech. L.J. 67. [본문으로]



 이전 글
이전 글  다음 글
다음 글  공인인증서 시대 가고 민간 전자인증 시대 도래
공인인증서 시대 가고 민간 전자인증 시대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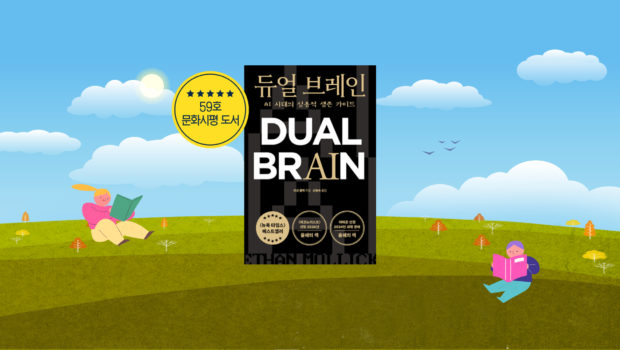 AI와 루만의 메모가 만날 때
AI와 루만의 메모가 만날 때  자율규제 관련 해외 기구 소개 및 최근 동향
자율규제 관련 해외 기구 소개 및 최근 동향  디지털 음원 관리의 세계 동향 및 향후 방향
디지털 음원 관리의 세계 동향 및 향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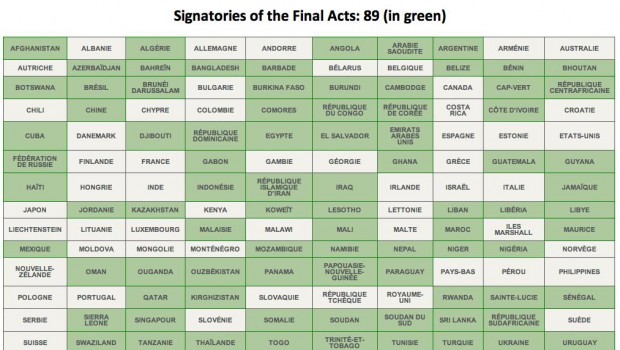 ITU 규칙 개정과 인터넷 규제 논란
ITU 규칙 개정과 인터넷 규제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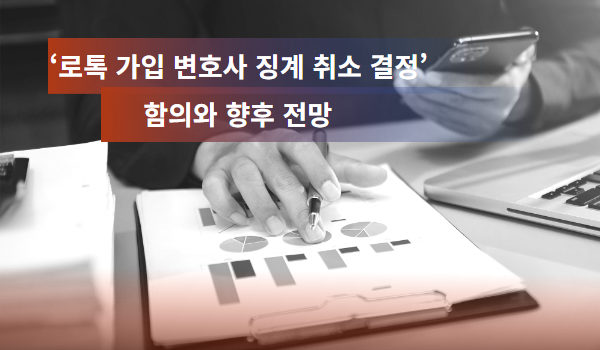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의 함의와 향후 전망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의 함의와 향후 전망  서비스 오픈정책과 이용자 보호
서비스 오픈정책과 이용자 보호  포털투명성 보고서 발간의 의미와 과제
포털투명성 보고서 발간의 의미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