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에 빼앗긴 주의(attention)의 회복을 말하다 – 제임스 윌리엄스, “나의 빛을 가리지 말라”(2022)에 관한 평(評)이 아닌 설(說) –

겉보기와 달리 책(특히 소설)을 무척 좋아하는 필자는 몇 년 전부터 가끔 소셜미디어에 ‘한 줄 서평’을 적고 있다. 많게는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소설 한 권을 필자가 감히 ‘한 문장’으로 평한다는 게 다소 부적절하고 때로는 교만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이쿠(はいく, 俳句)와 같은 촌철살인적인 글을 좋아하는 ‘극히 개인적인’ 취향과 서평이라는 형식의 글을 장문(長文)으로 풀어나갈 ‘능력 부족’을 핑계 삼아 꿋꿋이 취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개인사가 KISO 저널 편집위원회에서 서평을 부탁했을 때 선뜻 수락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수월하리라고 생각했던 당초 예상과 달리 제임스 윌리엄스의 “나의 빛을 가리지 말라”1 는 필자의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는 쉽사리 평하기 어려운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A5 크기에 미주(尾註) 포함 200페이지 조금 넘는 얇은 책이지만 사실 필자에게는 술술 읽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핑계로 서평을 쓰기로 한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여 아래와 같이 필자와 같은 사회 평균적인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이 책에 관하여 평(評)이라기보다는 설(說)을 풀어보는 수준에서 본고를 마무리하려 한다.
이 책은 ‘기술윤리학’에 관한 글이다. 저자는 학부에서는 문학, 대학원에서는 제품설계공학을 전공한 후 구글에서 10여 년간 검색 광고 분야에서 근무하다가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단순한 짜증을 넘어 더 깊은 차원에서 바닥이 흔들리고 몸이 바닥의 틈 사이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근본적인 주의 분산’을 느끼고”2 영국으로 건너가 옥스퍼드(Oxford)에서 기술윤리와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옥스퍼드에서는 필자도 익히 그 명성을 알고 있는 루치아노 플로리디(Luciano Floridi)의 지도를 받았다. 한마디로 기술윤리학이라는 학문에 관한 저자의 전문성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 책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필자의 취미인 ‘하이쿠식 서평’으로 표현한다면 “스마트폰에 한눈팔다가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른다.” 정도인 것 같다. 보다 고상하게(?) 표현해보자면, “첨단 정보기술이 인간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으니,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
사실 IT기술로 인한 주의력(집중력이라는 말이 보다 정확해 보이지만) 분산이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굳이 복잡한 이론이나 수사학적 표현에 기대지 않더라도 현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일정 정도는 주의력 분산을 직접 경험하고 있고, 이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필자의 경우에도 지금 이 글을 겨우 두 단락 정도 쓰는 와중에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두세 차례 꺼내어 오지도 않은 이메일과 메시지를 확인했다. 급히 확인해야 할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그렇다면 굳이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 책의 주제나 표현을 빌려 바꾸어 표현하자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나의 주의를 이 책을 읽는 것에 분산할 필요가 있을까?
우선 학술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주의를 투자하여 정독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책은 어렴풋이 인식해 온 “정보기술로 인한 주의력 분산”의 문제를 철학과 윤리, 기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론적ㆍ체계적으로 정리를 시도한 몇 안 되는(적어도 필자의 지식으로는) 글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정보기술이 인간의 주의를 끌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는 점을 분석하고(대표적으로 광고가 그러하다. 구글의 본질이 세계 최대의 광고회사라는 점을 생각해보라), 이에 터 잡아 오늘날 경제를 ‘디지털 경제’가 아니라 ‘디지털 주의력 경제(attention economy)’라고 명명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자의 접근법은 필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위 문제에 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학제적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였다. 이 책에서 인용하거나 저자가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경구(警句) 또한 필자에게 나름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데, 몇 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가 흘러넘치는 세상에서 정보의 풍요는 다른 무언가의 결핍을 의미한다. 즉 그게 무엇이든 정보가 소비하는 대상이 귀해진다. 그 대상은 명백하다. 정보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체의 주의를 소비한다. 그러므로 정보의 풍요는 주의의 결핍, 그리고 풍부한 정보 사이에서 주의를 효율적으로 할당해야 할 과제를 만들어낸다.”3
“주의란 무엇인가? …(중략)… “주의란 무엇인가”라고 묻기보다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무엇을 지불하게 되는가?”라고 묻는 편이 도움이 될 듯하다. …(중략)…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모든 것을 지불한다. 가령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 모든 목표, 취하지 않은 모든 행동, 다른 것들에 주목했더라면 될 수 있었던 모든 가능한 자신을 말이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때 가능했던 사라진 미래를 지불한다.”4
“현재 상황에서 주의력 경제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가장 숭고한 목적과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덕목을 약화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기술이 설계를 통해 이끌어내야 할 인간의 가장 좋은 부분은 무엇일까? 시스템은 우리에게서 분노 대신에 무엇을 이끌어내야 할까? 누스바음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정신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그리스어로 필로프로수네(philophrosune), 로마어로 후마니타스(humanitas), 성경에서는 아가페(agape), 그리고 아프리카어로는 우분투(ubuntu). 그건 악을 집요하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선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끈기 있는 기질을 뜻한다.”5
그러나 학술서적이 아닌 일반 교양서적으로서의 이 책의 가치(저자의 화법을 다시 한 번 빌리자면 ‘주의를 투자할 가치’)에 관하여는, 개인적으로는 다소 비판적인 입장이다. 주된 이유는 몇 번을 읽어 보았지만 다소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주의력이 분산되고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저자의 문제의식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에 관한 해결책 또한 제시되어야 앞뒤가 맞다. 그러나 적어도 이 책만 놓고 본다면 문제 제기 및 그 분석에 비하여 해결책은 양적, 질적으로 미흡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저자가 제기하는 해결책은 ‘광고의 목적과 본질의 제고’, ‘책임성, 투명성, 그리고 측정의 메커니즘 강화’ 등인데, 이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이어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주의력 분산을 촉발하고 있는 소위 ‘디지털 주의 경제’의 폐단을 다양한 관점에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자의 문제의식이 강제력이 없는 일종의 선언(manifesto)으로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온라인 광고 시스템은 인간의 주의력을 분산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윤리 원칙’을 둔다고 하여 온라인 광고가 주 수입원인 회사들이 매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러한 원칙을 자발적으로 따르려고 할 것인가? 사견(私見)으로는 소위 ‘윤리 원칙’에 기초한 신기술 규율은 현실성이 없는 ‘이상론’이며, 만약 신기술을 규율해야 한다면 법령과 같은 강제력 있는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제목(“나의 빛을 가리지 말라”)에 관하여 사소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평(評)이 아닌 설(說)을 마무리한다. 책의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위 제목은 고대 그리스 시대 철학자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더 대왕 사이의 유명한 일화에서 차용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위 일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알렉산더 대왕은 평소 존경하던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다. 마침 디오게네스는 거의 나체로 누워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에게 어떠한 소원이든 바로 들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누운 채로 알렉산더에게 “당신의 그림자가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일광욕을 즐기게 비켜라.”고만 일갈하였을 뿐, 다른 어떤 소원도 빌지 않았다. 이러한 일화가 과연 이 책의 주제인 ‘주의력 분산’에 관한 것일까? 오히려 권력이나 부와 같은 세속적 가치의 덧없음, 그리고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에 관한 것 아닐까? 물론 위 일화가 이 책의 주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적절한 사례라고 보기에도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물론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이 책의 제목을 “나의 빛을 가리지 말라”라고 붙인 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제명 선택 또한 이 책에서 일관되게 비판하는 ‘주의력을 분산하는 광고 메커니즘’의 일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 영문판은 다음과 같다. James Williams, Stand Out of Our Light – Freedom and Resistance in the Attention Economy -, Cambridge University Press(2018). [본문으로]
- 이 책 29-30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I felt … distracted. But it was more than just “distraction” – this was some new mode of deep distraction I didn’t have words for. Something was shifting on a level deeper than mere annoyance, and its disruptive effects felt far more perilous than the usual surface-level static we expect from day-to-day life. It felt like something disintegrating, decohering: as though the floor was crumbling under my feet, and my body was just beginning to realize it was falling.” [본문으로]
- 이 책 40쪽. 원문의 출처는 Simon, Herbert A. (1971). Designing Organizations for an Information Rich World. Computers, Communication, and the Public Interest (pp. 40–41).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본문으로]
- 이 책, 80-81쪽. [본문으로]
- 이 책, 128쪽(일부 재구성). [본문으로]



 이전 글
이전 글  다음 글
다음 글 ![[문화시평] 코로나 이후의 세계](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20/07/코로나-이후의-세계-서평-표지-620x350.jpg) [문화시평] 코로나 이후의 세계
[문화시평] 코로나 이후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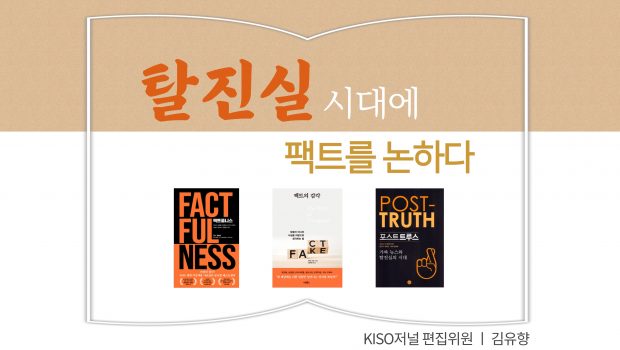 탈진실 시대에 팩트를 논하다
탈진실 시대에 팩트를 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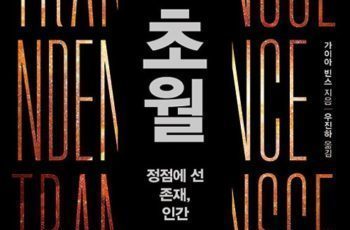 인간은 어떻게 모든 종을 초월한 존재가 되었는가?
인간은 어떻게 모든 종을 초월한 존재가 되었는가?  시간체제론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론
시간체제론의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론  뉴 노멀 : 디지털 혁명의 제2막, 진짜 새로운 것인가
뉴 노멀 : 디지털 혁명의 제2막, 진짜 새로운 것인가  레프 마노비치 저,『소프트웨어가 명령한다』
레프 마노비치 저,『소프트웨어가 명령한다』  경험의 멸종 The Extinction of Experience
경험의 멸종 The Extinction of Exper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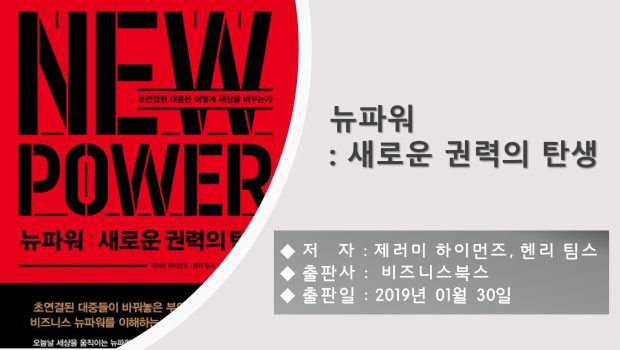 연결사회, 신권력 주인으로서의 초대
연결사회, 신권력 주인으로서의 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