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노멀 : 디지털 혁명의 제2막, 진짜 새로운 것인가
1. 두 개의 뇌를 가진 세대의 뉴 노멀 웨이브
2014년 2월 번역된 프랑스 철학자 미셸 세르(Michel Serres)의 저서『엄지 세대』는 새로운 세대의 출현과 그들의 특징에 대해 경쾌하게 논하고 있다(원서는 2012년 출판).『엄지 세대』는 미래학자의 장밋빛 전망이나 경영 실무나 기술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실존과 주체로서 새로운 인간의 출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철학자의 저서이되 심각하게 무겁거나 어렵지 않지만, 철학자의 저서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인간의 가치에 대해 논하고 있다.
세르가 논하는 엄지 세대는 두 개의 뇌를 가진 세대이다. 처형 당해 잘린 자신의 뇌를 들고 생 드니(Saint Denis)까지 걸어가 성인으로 추앙된 드니 주교처럼 엄지 세대는 클라우드, 웹, 노트북, 스마트폰에 자신의 뇌에 저장하는 것과 같은 정보를 저장하고 두 개의 뇌로 생활한다. 디지털 카메라를 굳이 ‘디지털’ 카메라가 아닌 그냥 ‘카메라’라고 표현하는 –디지털에 익숙한- 이들은 역사상 최초로 어른보다 많이 아는 세대가 되어 지식 습득 방법, 인간관계의 형성, 조직에서의 생활에 있어서 모두 새로운 가치를 표현한다.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이 세대는 이제까지의 흐름을 모두 재창조하는 신인류로 규정될 수 있다.
2014년 초,『엄지 세대』와 동시에 번역된 피터 힌센(Peter Hinssen)의『뉴 노멀』은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과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s)의 갈등보다 더 앞 선 이야기를 한다(원서는 2010년 출간). 이른바 디지털이 생활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잊혀진 것으로 평가될 시대에 새로운 가치는 무엇이고 이를 위해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소개하고 있다.
디지털 혁명의 제2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이 잊혀진『뉴 노멀』시대에는 정보 필터링(Information Filtering), 정보 큐레이터(Information Curator)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IT에서 기술(T, Technology)보다는 정보(I, Information)가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 시대에 길이의 한계는 0이 되고, 깊이의 한계는 무한대가 되며, 인내심의 한계는 1로 가고, 인텔리전스(Intelligence)의 한계는 실시간이 되며, 프라이버시(Privacy)의 한계는 없으며, 가격의 한계는 미지수가 된다.
뉴 노멀의 어항사회(Fishbowl Society)에서 프라이버시는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이고, 가격의 한계는 미지수라는 시장 친화적인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뉴 노멀』은 인문사회교양도서라기 보다는 비즈니스 혁신을 요구하는 경영 참고서에 가깝다. 그 안에서 인간 정체성의 변화와 그 원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제도의 역할, 시장의 팽창성과 그에 대한 책임 부과의 어려움과 같은 논의를 발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뉴 노멀』이 제시하는 가치의 미덕은 새로운 사회에서의 새로운 가치와 이에 대한 실천 전략(콘텐츠(contents), 협업, 인텐리전스, 지식 전략), 소비자 중심성 회복의 필요성, 기업과 소비자 관계의 중요성, T자형 인간(지식을 상황 전체에 적용하는 능력+기능적이고 전문적인 (학문분야로서의) 기술을 갖춘 인간)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
2. 기술 공존 시대의 불협화음
1995년 네그로폰테(Nicholas Negroponte)의『디지털이다(Being Digital)』와 1998년 돈 탭스콧(Don Tapscott)의『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Growing Up Digital)』은 정보사회의 본격화와 디지털 세대의 등장을 예고하였다. 그 후 웹 2.0(Web 2.0)과 소셜 미디어(Social Media)가 등장했고, 이제는 모바일(Mobile)의 본격화를 기다리는 시대가 되었다. 개방과 공유와 참여의 가치는 새로운 사회문화를 창조하고 그 기회를 향유한 누군가는 빠른 속도, 풍부한 정보와 다양한 선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회 속에서 인간 삶의 질이 좋아졌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IMT 2000을 홍보하던 LG의 TV광고에서 시장에서 생선을 고르던 남편은 집에 있는 아내에게 어떤 생선을 사가야 하냐고 휴대폰 화면으로 화상통화를 한다. 생선을 팔던 할머니는 “그게 뭐여”라고 물어보면 남편은 자랑스럽게 “디지털이잖아요”라고 답한다. 할머니는 이내 “뭐? 돼지털?”이라고 답한다. 휴대폰을 자유자재로 쓰는 세대와 디지털을 돼지털이라고 밖에 인식할 수 없는 세대 간의 차이가 보이는 지점이다. IMT 2000이라는 말이 기억도 나지 않는 오래된 그 시점의 광고에서 전하는 모습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세대간 차이는 더 벌어졌는지도 모르겠다. 1인 1스마트폰 시대가 되어, 모든 것이 기록되고 모든 것이 언제나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돼지목에 진주목걸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이다.
“뒤돌아보면 안된다”는 신의 말을 어겨 아내 에우리디케(Eurydice)를 잃은 오르페우스(Orpheus)처럼 현대 사회의 인간은 “앞만 보라”라고 잔뜩 강요당하고 있는 것 같다.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고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인간관계와 가치조차도 새롭게 형성된 지 채 20년도 되지 않았는데 그 20년 동안 본격적으로 출판된 많은 정보사회 관련 책들은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이내 도태되어 퇴물이 될 것이라고 윽박지르는 것 같다. 인간이 사는 동안 미래는 지속될텐데 계속 새로운 것만 고민하다가 죽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드는 순간이다. 개인차는 있을 지언정 정보사회에서도 여전히 삶의 질에 대한 고민, 세대 갈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세 가지 요소는 불협화음을 내며 삐거덕거리고 있다.
3. 현실을 반영한 미래 성찰
우연히도 동시에 출간된 한 권의 철학책과 한 권의 경영 참고서는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 두 권의 책이 현재의 우리 상황에 시사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명의 본래의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피터 힌센의 지적처럼 이제는 디지털 혁명의 두 번째 시기인 것은 맞는 것 같다. 웹 1.0, 웹 2.0, 소셜 미디어, 모바일과 같은 신기술의 발전이 디지털 혁명의 첫 번째 시기에 디지털을 알아야 한다는 ‘능력’의 문제를 강조한 것이라면 그 이면에 흐르는 주체의 변화와 방식의 변화, 나아가 사회 변화를 담보한 두 번째 디지털 혁명의 시기는 디지털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제는 넘쳐나는 기술보다는 정보와 콘텐츠, 콘텐츠를 아우르는 이미지와 스토리텔링, 그 모든 것을 구현할 수 있는 상상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으며 힌센의 지적처럼 4I(Information, Intelligence, Integration, Innovation)가 핵심 원리가 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변화의 지점에서 앞만 보고 갈 것인지 잠시 멈춰 성찰할 것인지는 각자의 몫이다. 오르페우스는 신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아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늘의 별이 되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앞만 보고 가느냐, 뒤를 돌아보느냐의 문제만큼 누구와 어떻게 가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능력보다 의지가 중요해지는 디지털 사회의 제2라운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디로, 누구와 어떻게 갈 것인가이다. 두 책은 사회 변화의 내용을 소개하고 새로운 세대와 전략적으로 공존하는 방법을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독한 만한 가치가 있으며, 현재를 살아가는 주체와 전략을 명료하게 진단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과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세대와 뒤따라가는 세대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보아야 할 많은 것들이 놓여져 있다. 뉴 노멀의 새로운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녹녹찮은 현실이 그것이다. 즉, 취직도 어렵고 무한경쟁의 블랙홀 속에서 끊임없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허울만 새로운 엄지세대가 고가의 통신요금과 통신기기값을 스스로 지불하면서 자유로운 뉴 노멀의 세상을 과연 만끽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새로운 세대는 아주 자유롭게 새로운 가치를 획득하고 올드한 사람들은 새로움을 뒤따라가지 못해 헉헉 거릴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올드한 돼지털 세대가 통신요금과 통신기기값을 지불하면서 엄지세대를 먹여살려야 한다는 역전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화와 가치가 우리의 미래에 아무리 아름다운 유토피아처럼 놓여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현실에서는 유토피아까지 걸어가야 할 길이 가시밭길이라는 슬픈 현실을 두 권의 책에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삶의 질에 대한 고민, 세대 갈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 두 권의 책으로 해결될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모든 정보사회 관련 저작에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부분은 새로운 가치의 쟁취만큼 풀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사회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그것이다. 아직 수많은 격차(Divide)가 남아 있고, 새로운 기기에 몰입하는 것만큼 사회를 돌아보면서 지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지하철에서, 모임에서, 학교에서 오로지 자신의 휴대폰만 바라보고 옆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이 엄지세대의 자화상이라면 우리는 노멀한 시대가 더 좋았노라고 회상할지 모른다. 그래서 ‘새로운(New)’ 것이 진정한 새로움을 획득하기는 아직은 너무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Serres, Michel(2012). Petite Pouchette. Le Pommier. 양영란 역. 2014.『엄지세대 : 두 개의 뇌로 만들 미래』. 서울 : 갈라파고스.
Hinssen, Peter (2010) Digitaal is het nieuwe normaal. Uitgeverij Lannoo nv. 이영진 역. 2014.『뉴 노멀 : 디지털 혁명 제2막의 시작』. 서울 : 흐름출판.



 이전 글
이전 글  다음 글
다음 글  적절히 불편해야 행복하다는 역설 같은 진리 ‘편안함의 습격’
적절히 불편해야 행복하다는 역설 같은 진리 ‘편안함의 습격’  고독이 없는 시대에는 대화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진다
고독이 없는 시대에는 대화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진다  ‘권력과 진보 : 기술과 번영을 둘러싼 천년의 쟁투’ 서평 (Power and Progress : Our Thousand-Year Struggle Over Technology and Prosperity.)
‘권력과 진보 : 기술과 번영을 둘러싼 천년의 쟁투’ 서평 (Power and Progress : Our Thousand-Year Struggle Over Technology and Prosperity.)  2014 KISO 워크숍 및 자율규제 세미나
2014 KISO 워크숍 및 자율규제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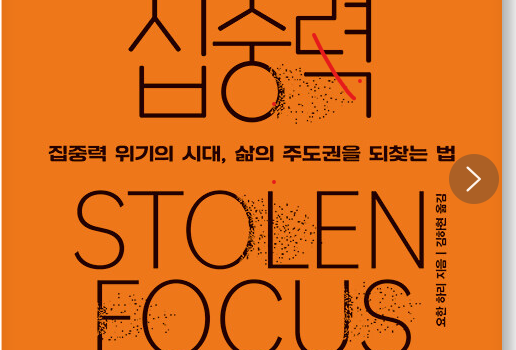 도둑맞은 집중력
도둑맞은 집중력  정보를 만든 인류는 왜 정보에 조종당하는가?
정보를 만든 인류는 왜 정보에 조종당하는가?  당신의 프라이버시는 죽었다: SNS의 보이지 않는 위협
당신의 프라이버시는 죽었다: SNS의 보이지 않는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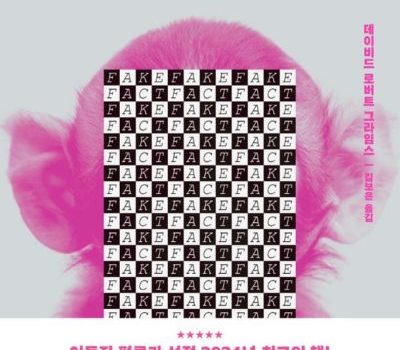 페이크와 팩트 – 왜 합리적 인류는 때때로 멍청해 지는가(The Irrational Ape)
페이크와 팩트 – 왜 합리적 인류는 때때로 멍청해 지는가(The Irrational A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