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법의 조망과 우리 법과의 비교

1.서론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하 “AI법”이라 한다)이 2025년 5월 28일에 제정되고, 같은 해 6월 4일에 공포되었다.1 AI법은 총 28개의 조(條)가 4개의 장(章)에 배치되어 있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법률인데, 이 중에서 총 17개의 조(條)에 해당하는 제1장 총칙과 제2장 기본적 시책에 관한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밖에 총 11개의 조(條)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기본계획(人工知能基本計画)에 관한 제3장과 인공지능 전략본부(人工知能戦略本部)에 관한 제4장의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일본이 AI법을 제정한 이유를 일언으로 요약하면, 인공지능에 관한 일본의 내·외부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즉,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각자 나름의 접근방식에 따라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국가 발전에 있어 인공지능의 높은 기여도와 이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불안을 가지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규제나 규칙의 논의가 뒤처져 있는 등 여러 복합적인 사정2이 AI법의 입법 배경에 놓여 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AI법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는「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라 한다)이 일본보다 이른 2025년 1월 21일 제정되었는데, 그 시행일은 일본보다 늦은 2026년 1월 22일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인공지능기본법이 입안 당시부터 시행 전인 현재까지 다양한 문제점과 의견3이 나타나 있는 법률임을 감안할 때, 이미 시행중인 일본의 AI법과 관련한 사항의 검토는 우리 인공지능기본법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내는데 일조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AI법에 관한 주요 내용 등을 조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법률과의 차이점 등을 개략적으로 확인하여 본다.
2. AI법의 개요 및 인공지능기본법과의 비교
AI법은 이 법의 목적(제1조)과 정의(제2조) 규정을 비롯하여 인공지능의 연구개발・활용에 기본이념(제3조), 관련 주체의 책무(제4조~제10조), 국가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 관한 기본적 시책(제11조~제17조), 인공지능 기본계획(제18조), 기본적 시책의 실시를 위한 인공지능 전략본부(제19조~제27)에 관한 규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따라 각 규정의 개요 등을 검토한다.4
가. 목적(제1조)
AI법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추진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인공지능기본법의 경우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달리할 뿐 큰 틀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정의(제2조)
AI법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인공지능 관련 기술”에 관해서만 해당 규정에 정의되어 있다. AI법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인공적인 방법에 의해 인간의 인지, 추론 및 판단에 관한 지적인 능력을 대체하는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입력된 정보를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출력하는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처리 시스템에 관한 기술”로 구별하여 정의한다. 이렇게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 관한 범위를 넓게 파악한 이유는 국제적인 논의의 동향을 감안하여 향후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에 있다5고 한다.
인공지능기본법은 동 법에서 사용되는 여러 용어를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일본과 달리 각 호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의 지적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제1호)으로, “인공지능기술”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로, “인공지능시스템”은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실제와 가상환경에 영향을 주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으로 정의한다.6
다. 기본이념(제3조)
AI법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특성을 감안하여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법(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基本法)」 등에서 규정한 광범위한 기본이념에 덧붙여,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등에 특화된 사항을 이하의 항목에서 기본이념으로 정하고 있다(제1항). 즉, ⅰ) 연구개발력의 유지와 국제경쟁력의 향상(제2항), ⅱ) 기초연구부터 활용까지의 각 단계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제3항), ⅲ) 적정한 연구개발·활용을 위한 투명성 확보 등의 시책 마련(제4항), ⅳ) 국제협력에서의 주도적 역할(제5항)이 AI법의 기본이념에 해당한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ⅰ)인공지능 기술과 인공지능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제고를 통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것과 ⅱ) 영향받는 자가 설명을 제공받을 것을 나열하고 있다. 인공지능기본법 전반에 걸친 규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일본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이지만, 규정의 표현이 어색하고 산만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다.
라. 책무(제4조 내지 제10조)
AI법은 기본이념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기술과 관계된 국가, 지방공공단체, 연구개발기관7, 활용사업자8 및 (일본)국민 각각에 대한 책무(責務)를 규정하고 있다. 각 주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ⅰ) 국가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 제9조 및 제10조). ⅱ)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의 책무에 관한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여 자신의 구역의 특성을 살린 자주적인 시책을 실시할 책무가 있다(제5조). ⅲ) 연구개발기관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과 전문적이고 폭넓은 지식을 가진 인재육성,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시책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제6조). ⅳ) 활용사업자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업활동의 효율화 및 고도화와 신사업 창출에 노력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제7조). ⅴ) (일본)국민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깊게 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제8조).
한편, 우리의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9(제3조 제3항 및 제4항) 및 인공지능사업자(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에 대한 책무나 의무를 여러 조항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책무(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대응되는 각 주체의 책무(의무)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인공지능사업자의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로 세분하여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차이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된다.
마. 기본적 시책(제11조~제17조)
AI법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 관하여 국가가 실시하여야 하는 기본적 시책으로 ⅰ) 일관된 연구개발의 추진(제11조), ⅱ) 연구개발기관·활용사업자를 위한 관련 기반 조성(제12조), ⅲ) 적정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규범에 부합한 지침 정비(제13조), ⅳ) 전문적이고 폭넓은 지식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인재 확보·육성(제14조), ⅴ) 국민 대상 교육·학습의 진흥 및 홍보(제15조), ⅵ) 조사연구(정보수집,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사안의 분석·대책검토 등) 및 필요한 조치 마련(제16조), ⅶ) 국제협력 추진 및 국제적 규범 정립의 적극적 참여(제17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기본법은 제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AI법 제11조 내지 제17조와 동일·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즉, 인공지능기본법은 일본과 같이 국가의 “기본적 시책”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곧바로 정부가 수립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항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바. 인공지능 기본계획(제18조)
AI법은 정부가 기본이념에 따라 기본적 시책을 토대로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추진에 관한 ⅰ) 시책의 기본방침, ⅱ) 정부가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책, ⅲ)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2항).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 인공지능기본법 제6조에도 이와 동일·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있는데, 우리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기본계획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이 차이가 난다.
사. 인공지능 전략본부(제19조 내지 제28조)
AI법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内閣)에 인공지능 전략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인공지능 전략본부는 정책의 기본계획안의 작성과 실시 등을 담당하며(제20조), 총리(内閣総理大臣)를 본부장으로, 관방장관(内閣官房長官) 및 인공지능전략담당장관(人工知能戦略担当大臣)을 부본부장으로, 그 외 국무위원(国務大臣)을 구성원으로 한다(제21조~제24조). 한편, 인공지능 전략본부의 사무는 내각부(内閣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제26조), 주임 장관은 총리로 한다(제27조). 이러한 인공지능 전략본부는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등을 비롯하여 관련자 또는 기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제25조). 그 밖에 인공지능 전략본부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제28조).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지능기본법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일본의 인공지능 전략본부에 해당하는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지만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비롯하여, 국가안보실의 차장,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 관련 수석비서관, 대통령이 위촉한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총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제7조). 문언상으로만 보면, 同 위원회가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으므로, 일본보다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적이고 심화된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AI법을 조망하면, 일본이 국가적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핵심 기술로 인식하고 그 진흥과 통제의 양립을 선언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10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이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후발주자로서 처해 있는 상황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제도적 단초가 되는 법률의 성격이 일본의 경우 기본법적 성격이 강하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법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AI법의 제정 이후 공개된 『종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5(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2025)(2025年 6月 6日 閣議決定)』과 향후 공개될 예정인 각종 조사 보고서나 지침(가이드라인)을 살펴봄으로써, 시행 전부터 논란이 있는 우리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法律 第53号(官報, 号外 第123号, 令和7(2025)年 6月 4日). [본문으로]
- AI 戦略会議·AI 制度研究会(2025. 2. 4.), 『中間とりまとめ』, Available : https://www8.cao.go.jp/cstp/ai/interim_report.pdf<2025. 8. 11. 최종방문>, 1-4頁; 朝日新聞(2024. 5. 24.), 「日本出遅れた」 AI規制, 国際議論のリードも困難 専門家の評価は, Available : https://www.asahi.com/articles/ASS5Q4D1GS5QULFA01NM.html<2025. 8. 11. 최종방문>; 内閣府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推進事務局 AI制度審議室(2025. 7. 15.),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令和7年法律第53号)の概要(論説)”, 『NBL(1294号)』, 商事法務, 4-6頁 참조. [본문으로]
- 제419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2024. 12. 17), 국회사무처, 29-37면; 박상철(2024),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 전 개정 필요성-규제 조항의 체계·축조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보법학(제28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5-50면; 정찬모(2025),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내용의 검토와 향후 과제”, 『法學硏究(第28輯 第1號)』,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71-10면; 김현경(2025. 3.), “「AI 기본법」 주요 내용과 시행과제”, 『KISO저널(Vol.58)』, 한국인터넷자율기구, 12-20면; 한겨레 신문(2025. 7. 28.), 환영받지 못하는 ‘AI 기본법’…정부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 시민사회 “위험한 기술을 일단 만들게 해달라는 식은 위험”, Available :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210376.html<2025. 8. 11. 최종방문>; 전자신문(2025. 6. 24.), [전문가 기고]AI 기본법, 시행 유예·재검토 필요하다(이성엽 고려대 교수), Available : https://www.etnews.com/20250624000147<2025. 8. 11. 최종방문> 등 참조. [본문으로]
- 지면 관계상 해당 규정의 원문 또는 그 번역문 전체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본문으로]
- 이러한 인공지능 관련 기술에는 데이터의 학습을 고속화하기 위한 반도체 기술이나 학습 데이터의 클리닝・정규화 기술,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을 나타내는 식별정보를 콘텐츠에 삽입하는 「워터마크」 기술이나, 부적절한 출력을 억지하는 필터링 기술 등이 포함된다(内閣府 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推進事務局 AI制度審議室(2025. 7. 15.),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令和7年法律第53号)の概要(論説)”, 『NBL(1294号)』, 商事法務, 7頁 참조). [본문으로]
- 인공지능기본법의 인공지능 등에 관한 정의 규정에 대한 비판은 박상철(2024), “인공지능 기본법의 시행 전 개정 필요성-규제 조항의 체계·축조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보법학(제28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7-33면 참조. [본문으로]
- AI법은 “연구개발기관”을 “대학,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법(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基本法)」 제2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법인, 그 밖에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의한다(제6조 제1항). [본문으로]
- AI법은 “활용사업자”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자, 그 밖에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사업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자”로 정의한다(제7조). [본문으로]
- 가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경제·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변화에 대응해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다(제3조 제2항 및 제3항). 또한 同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일반적 책무 외에, 학습용 데이터 관련(제15조), 중소기업등의 특별 지원 관련(제17조), 인공지능 융합 촉진 관련(제19조), 전문 인력 확보 관련(제21조), 데이터센터 관련(제25조),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 관련(제29조) 시책 등을 개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이수경(2025), 『AI기본법』, 커뮤니케이션북스, 15면 참조). [본문으로]
- 石破茂 發言, 第14回 AI戦略会議(2025. 6. 2.), Available : https://www.kantei.go.jp/jp/103/actions/202506/02ai.html <2025. 8. 11. 최종 방문> 참조. [본문으로]



 이전 글
이전 글  다음 글
다음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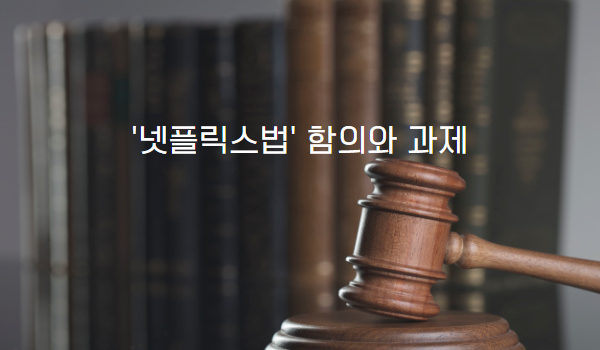 ‘넷플릭스법’ 함의와 과제
‘넷플릭스법’ 함의와 과제  개인정보 필수 동의와의 이별을 준비하며
개인정보 필수 동의와의 이별을 준비하며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의의와 한계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의의와 한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미와 과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미와 과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의 개요 및 향후 과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의 개요 및 향후 과제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결  콘텐츠 관련 분쟁에 있어서 ADR의 발전
콘텐츠 관련 분쟁에 있어서 ADR의 발전